인기 검색 계정
서리달(@qlipha) 인스타그램 상세 프로필 분석: 팔로워 1,755, 참여율 5.47%

@qlipha님과 연관된 프로필
연관 프로필이 없습니다
이 계정에 대한 연관 프로필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qlipha 계정 통계 차트
게시물 타입 분포
시간대별 활동 분석 (최근 게시물 기준)
@qlipha 최근 게시물 상세 분석
이미지 게시물 분석
여러 장 게시물 분석
@qlipha 최근 게시물

소외로운 사랑으로 서툴게나마, 오지 않을 당신의 부재를 채워봤다. _시선과 버릇中 #책 #글 #에세이 #인간관계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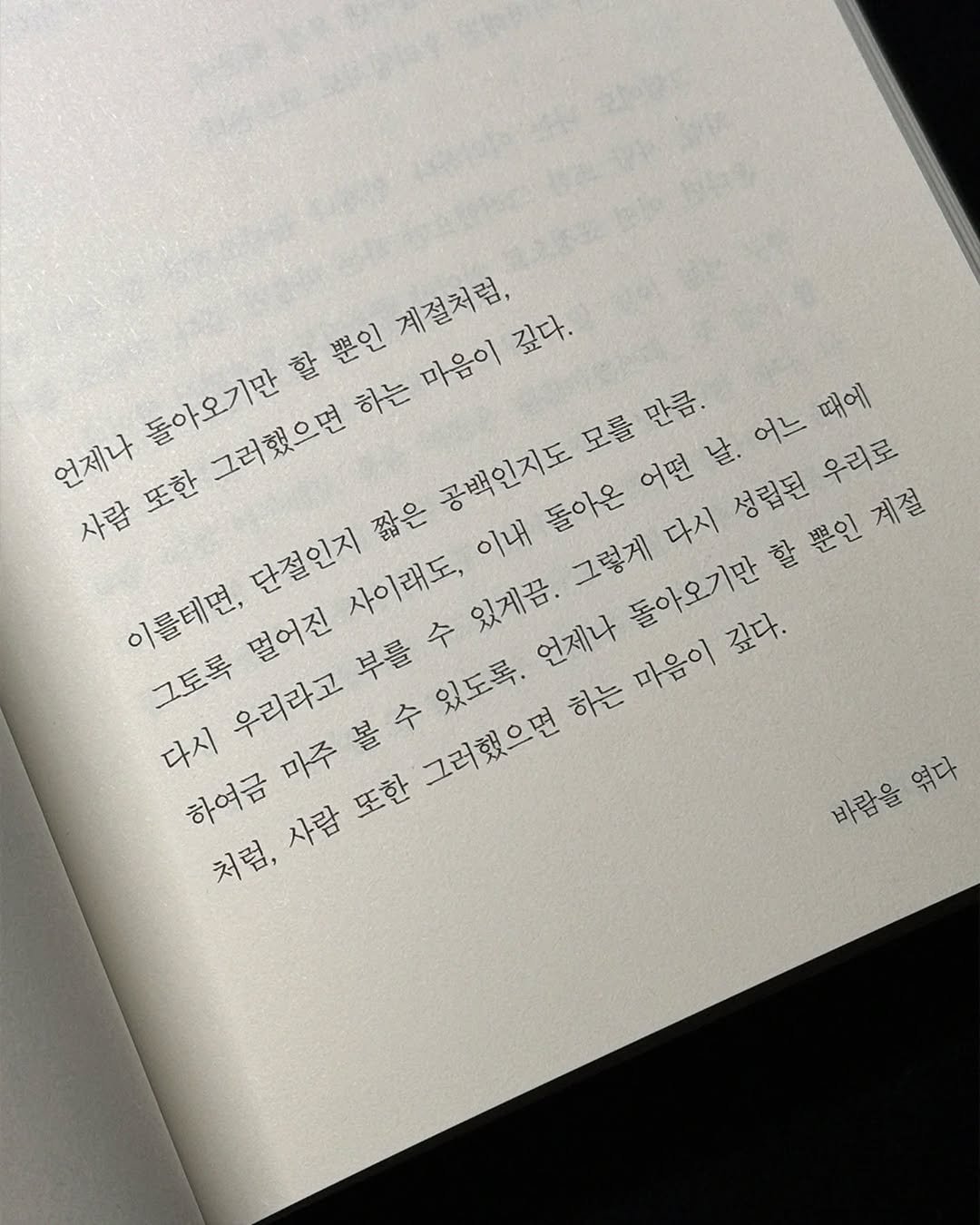
언제나 돌아오기만 할 뿐인 계절처럼, 사람 또한 그러했으면 하는 마음이 깊다. 이를테면, 단절인지 짧은 공백인지도 모를 만큼. 그토록 멀어진 사이래도, 이내 돌아온 어떤 날. 어느 때에 다시 우리라고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성립된 우리로 하여금 마주 볼 수 있도록. 언제나 돌아오기만 할 뿐인 계절처럼, 사람 또한 그러했으면 하는 마음이 깊다. _시선과 버릇中 #책 #에세이 #글 #인간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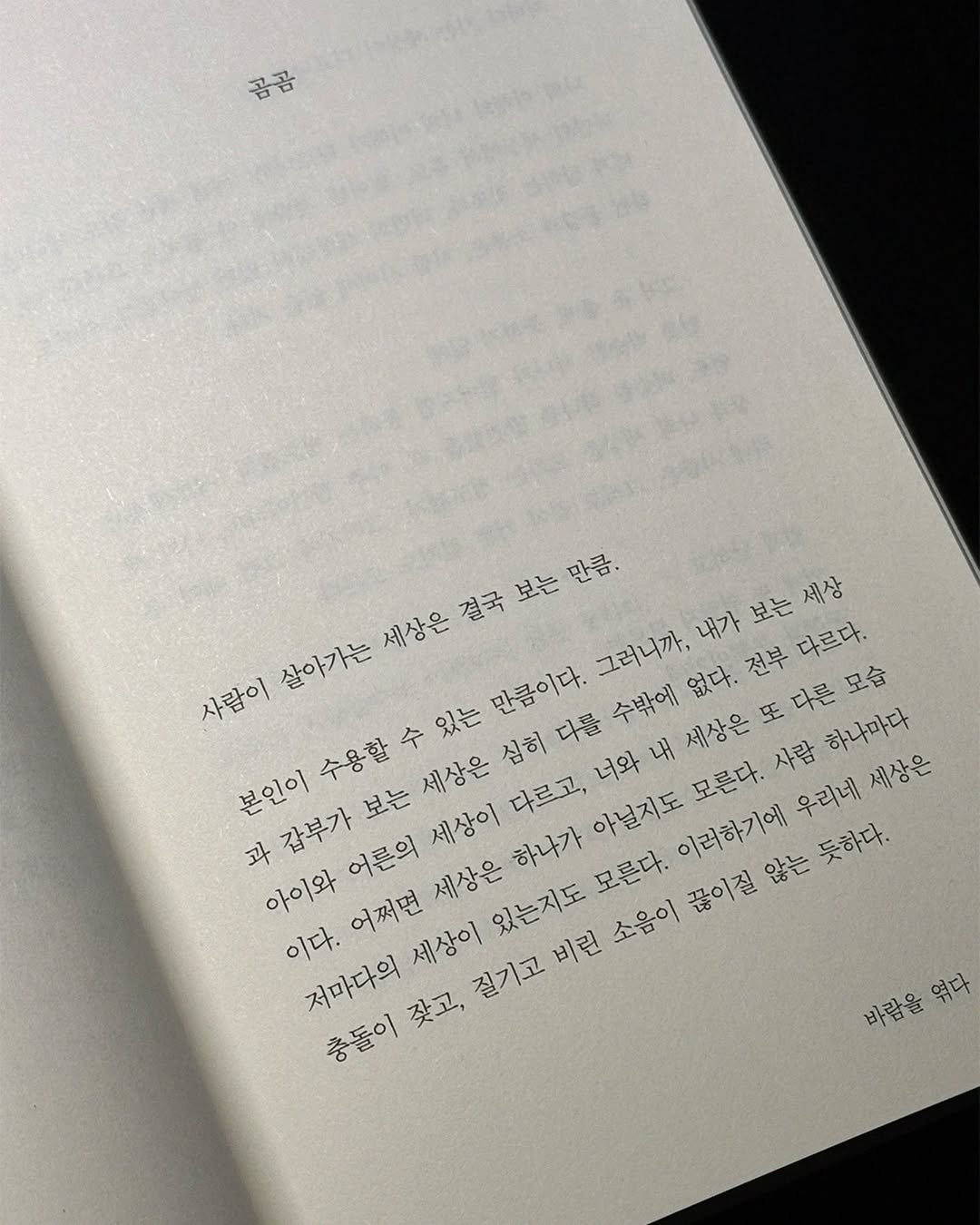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보는 만큼.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과 갑부가 보는 세상은 심히 다를 수밖에 없다. 전부 다르다. 아이와 어른의 세상이 다르고, 너와 내 세상은 또 다른 모습이다. 어쩌면 세상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 하나마다 저마다의 세상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하기에 우리네 세상은 충돌이 잦고, 질기고 비린 소음이 끊이질 않는 듯하다. _시선과 버릇中 #인간관계 #일상 #글 #책 #에세이

잊어버리는 게 너무 쉬워서 큰일이라는 사람들이 때때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금방 비워내고 금방 채워내 또다시 비워내는 일이, 내게도 쉬운 일이었더라면 오늘의 색깔은 풍요로웠을까요. 요즘의 사람들이 일컫는 삶이란, 새로운 것들로 덧칠하고 채워내는 삶이라는 것 같은데요. 오늘로 머물러주지 못한 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안타까웠고, 시간에 희석되지 못한 감정이 너무 많아서 삶을 논하는 찰나가 이따금씩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나의 오늘이거늘 어쩌겠습니까. 다르게 사는 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여기 이곳에 부재중이더라도 필히 지켜내야 될 게 있었습니다. _ 그림씨, 2026.02.04 #글 #일상 #산문 #인간관계

지금의 나를 남김없이 다 태워낸 후에야 오는 게 성장이었고, 솔직히 요즘에는 더 태울 내가 마땅치 않아서 한숨이 늘었습니다. 담배가 늘었습니다. 담배를 한 개비 또 깨물고 태워대면서 괜히, 내 그늘이 드리워져 잔뜩 어두워진 천장을 노려봅니다. 내가 목적하며 살아왔던 이상과, 도착해야 될 곳이 과연 어디쯤이겠는지 다시금 복기해봤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애쓰면 될 것만 같은데, 이쯤에선 조금이라는 단위가 우주를 헤아리는 단위가 아닐까 의심스럽지요. 하여튼 저는 작년에도 어김없이 편치를 부쳤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거듭된 실망과 설움은 서른 번에 나눠 삼키고서, 또다시 이곳저곳에 느린 편지를 부치겠지요. _ 찔레꽃, 2026.01.14 #산문 #일상 #글 #인생

얼마만치 곱씹어도 불평밖에 나오질 않는 시간을 힐끔 흘겨봅니다. 또 지나갔습니다. 외면한 채로 바라보고 있는 풍경은 그다지 바뀌질 않았는데, 시간은 잘도 지나갑니다. 이어서 시간이 이러한 만큼 한때 ‘너’라고 불렀던 그들 또한 몇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있었던 적 없는 사람이라 믿어보기로 했는데 역시 좀 어렵긴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겠다며 부단히 애쓴다고 해서, 한때 그러했던 시간이 휘발되거나 하진 않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문득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영 믿음직하진 않았습니다. _ 이레, 2025.12.24中 #글 #인간관계 #일상 #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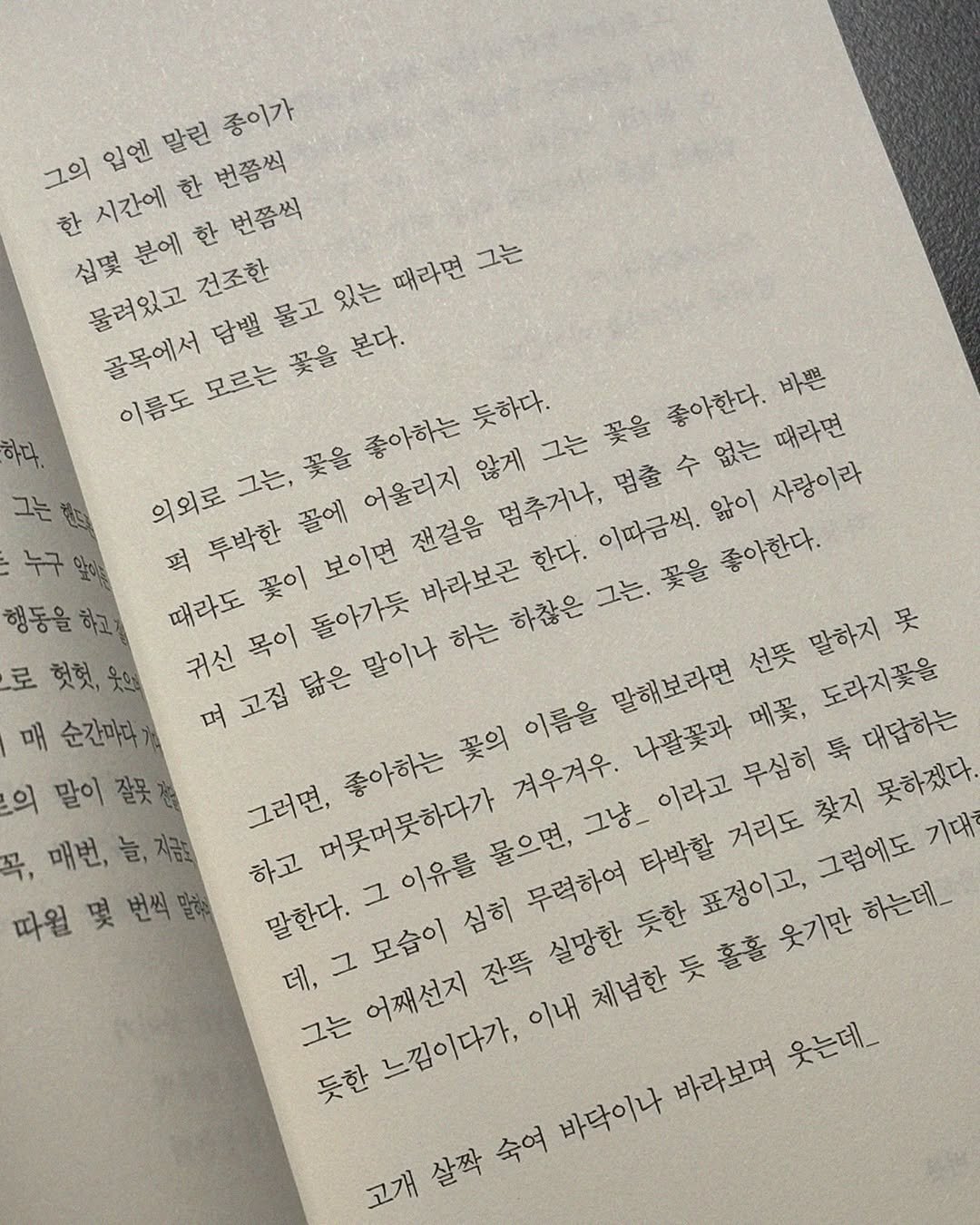
의외로 그는, 꽃을 좋아하는 듯하다. 퍽 투박한 꼴에 어울리지 않게 그는 꽃을 좋아한다. 바쁜 때라도 꽃이 보이면 잰걸음 멈추거나, 멈출 수 없는 때라면 귀신 목이 돌아가듯 바라보곤 한다. 이따금씩, 앎이 사랑이라며 고집 닮은 말이나 하는 하찮은 그는. 꽃을 좋아한다. _시선과 버릇中 #일상 #글 #에세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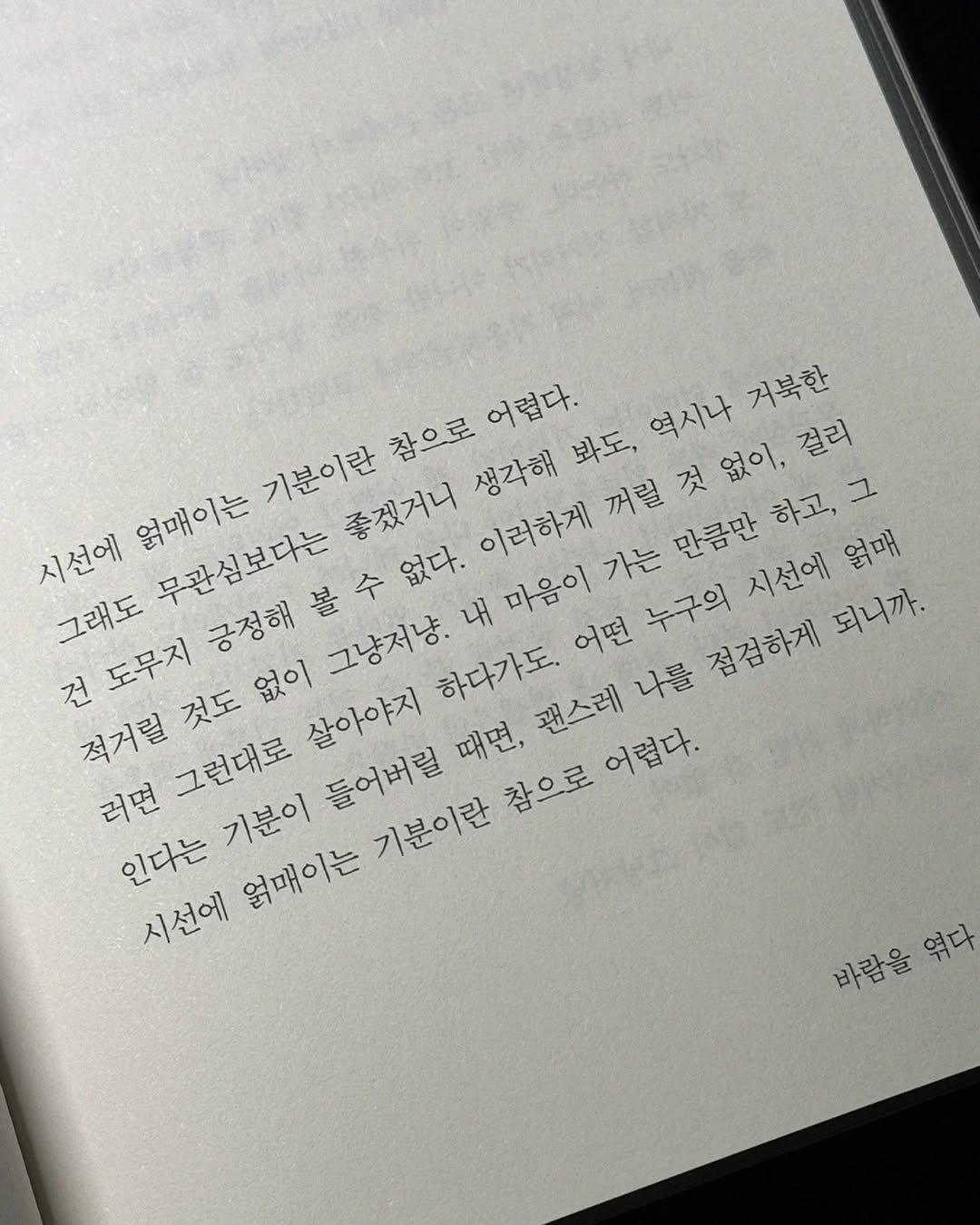
시선에 얽매이는 기분이란 참으로 어렵다. 그래도 무관심보다는 좋겠거니 생각해 봐도, 역시나 거북한 건 도무지 긍정해 볼 수 없다. 이러하게 꺼릴 것 없이, 걸리적거릴 것도 없이 그냥저냥. 내 마음이 가는 만큼만 하고, 그러면 그런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떤 누구의 시선에 얽매인다는 기분이 들어버릴 때면, 괜스레 나를 점검하게 되니까. 시선에 얽매인다는 기분이란 참으로 어렵다. _시선과 버릇中 #글 #책 #인간관계 #일상 #에세이

서리달: 상월霜月 1. 서리달 얼마나 긍정을 부둥켜안아도 겨울이 싫다. 존나 싫다. 종말론적 생각을 연장시켜 말하면,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겨울이라는 계절이 영영 사라졌으면 좋겠다. 해수면 상승이고 뭐고, 뭣 같은 계절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면 기꺼이 잠겨 죽을 각오다. 고교시절의 겨울. 생전 처음 가본 라오스에서 설렘보단 평온함을 느꼈던 것도. 이 지독한 겨울 혐오가 이유라면 이유겠다. 겨울이란 계절이 한 번 좋았던 적 없다. 겨울의 초입에 자리한 생일. 그딴 의미 없는 것을 이유로 애정을 가지기도 싫다. 인생을 돌아보면 끝이 안 보이는 비관이 이무기처럼 늪을 기어 다닌다. 이 비관의 시발점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찾아냈던 편린 닮은 존재들. 사랑할 뻔했던 인생. 나를 형이라 부르며 따르던 한 살 어린 코흘리갠 열두 살이란 나이로, 내가 따르던 형은 서리 얼어붙던 초겨울에 땅을 잃었고, 유일한 어른. 나의 스승님 김쌤은 눈발 짙어지는 정월 끝자락에 소천하셨다. 제설 끝난 산골짜기 군부대. 고향 친구의 자살 소식을 마지막으로 겨울을 향한 내 시선은, 혐오를 넘어선 무엇으로 뻗었다. 무엇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겨울이라도 탓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비관이 가리키는 건 소멸을 바라는 유아론이기에. 2. 려(戾) 추억이 된 오컬트 만화의 신간을 구매했다. 신간이라 부르기도 이상하다. 꽤나 예전에 나온 책이니까. 뭐, 어쨌든 구매했다. 중지와 휴재를 거듭하느라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 만화는 어느새 부제가 바뀌었다. 어그러지다, 또는 되돌린다는 뜻의 려(戾)가 틀어박혔다는 뜻의 롱(籠)을 밀어냈다. 올드한 노랠 틀어두고 한 장씩 넘기는 흑백. 역시 스가 시카오의 카제나기(風なぎ)와 어울린다. 그의 노랫말처럼 누구를 원망하면 되냐는, 무엇을 억누르면 되냐는. 슬픔 만연한 물음에 어울리는 주인공이다. 약속 없는 이별임에도 기다리는 주인공(主人公). 제 시간을 멈춰, 영원히 자신을 지켜보는 주인공은 언제쯤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름답다면 나 또한 그리될 수 있을까. 그들을 더 이상 꿈이 아닌 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 먼 훗날에 이런 나도 감히 속 편히 웃어볼 수 있을까. 시계를 어디까지 돌리면 겨울을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 #Mort_Histoire





























